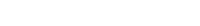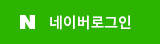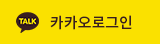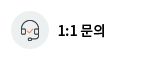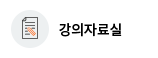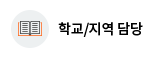초판발행 2025.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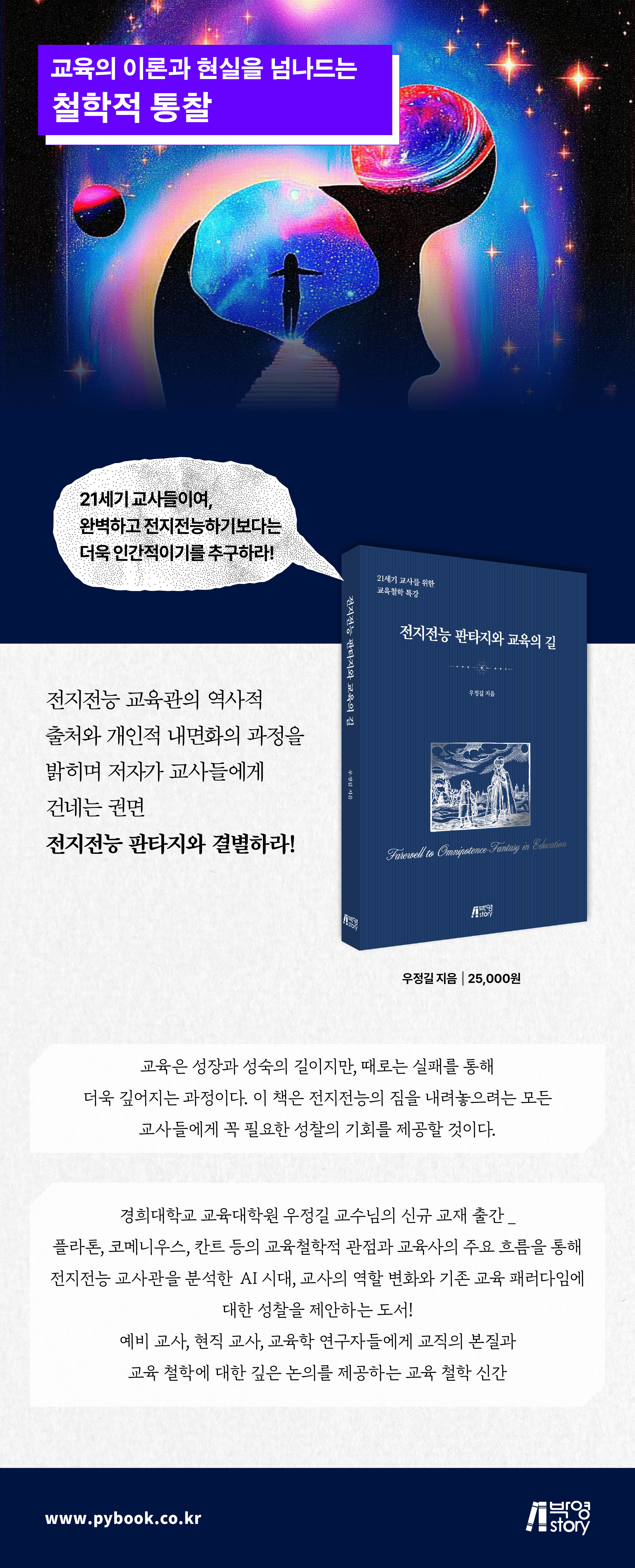
<머리말>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교사들은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거친 후에 교사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로부터 교육학의 이론들을 소개받고, 이 이론들이 함의하는 바를 학습하고 성찰하면서 내면화하게 된다. 이 과정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하는 이론들로 구성된다. 교육의 난점과 한계에 대하여 회의와 푸념을 전달하는 이론들을 굳이 교원양성 단계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교육에 관한 낙관적 신념을 전제로 수립된 이론들이 채택되어 교수된다. 교육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긍정적·낙관적 신념으로 가득찬 교육학 이론들은 대부분 진취적이며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 진취와 희망은 교원임용고사라는 관문을 통과할 동력이 되어준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할 무렵, 즉 예비교사가 교사가 될 즈음, 낙관적 교육관의 내면화는 정점에 다다른다. 잘 가르치면 잘 배울 것이고, 정성들여 기르면 반듯하게 길러질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만들면 그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교육관을 실어나르는 교육 이론들은 초임 교사들을 긍정의 기운으로 무장시킨다. 이 낙관의 전투복을 갖춰 입은 초임교사들은 어쩌면 당분간은 이론과 현실이 상응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초임교사 특유의 호연지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교육의 기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의문이 조금씩 누적되어 갈 즈음, 학교현장실습 시절 멘토교사가 했던 말이 뇌리에 스치기도 한다. “대학에서 공부했던 교육학 이론은 다 잊어버리세요. 진짜 교육학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서적과 임용고사 자료는 책장 한 켠으로 제쳐두고, 때로는 선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교사 연구공동체의 문을 두드려 보면서, 실전에서 교육과 교직을 다시 배우고 그것을 교직 활동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때로는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는 최신 교수법의 아이템들을 새롭게 장착하여 활용해 보기도 한다. 물론 이 최신 교수법이 내년에도 최신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군가는 이름 있는 교육대학원의 교사 재교육 과정에 등록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육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또 때로는 답답함을 그저 외면하는 방식으로 내적 평온을 유지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는 교사들에게 언제나 평균 이상의 책무성을 요구한다. 즉, 교직은 신성한 직분이라는 고전적인 생각에 근거하여, 혹은 적어도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현대적 인식에 근거하여, 사회는 교사에게 무한의 혹은 상당한 정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교사는 마음가짐에서 몸가짐에 이르도록 매사에 흠이 없어야 하며 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 동일한 선행이라도 교사에게는 당연한 의무이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윤리적 비판이 가해진다.
사회적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그 전모를 확인하게 되겠지만, 전통적 교육이론은 교사에게 절대에 가까운 권능을 부여한다. 한때 교사는 신의 형상이라는 은유를 통해 신의 완전성을 모방하여야 하는 책무성을 강요받았으며, 또 한때 교사는 동물보다 더 고등한 인간 존재를 교육하는 더욱 고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멀지 않은 미래에 AI와 경쟁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이미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건대, 현대의 예비교사 즉 근미래의 교사는 중세의 신에 이어 또 하나의 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과거의 신은 생명을 바쳐 인간을 사랑하였고 교사는 그의 자비로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그의 빛을 교육적으로 대리하여야 한다는 계시라도 제시하였던 반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기계신은 아직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AI가 인간교사의 조력자가 될지 혹은 경쟁이 도무지 불가능한 차가운 경쟁상대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여도 교직은 참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 상황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처한 그들만의 사회적 맥락도 교사들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바로 강요된 중립성의 요구이다. 교사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중립적이야 하며, 따라서 표현과 활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과업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과 교직 여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의 통로마저 묘연한 경우라면, 객관성과 중립성의 의무는 때로 견디기 힘든 침묵의 강요와 동의어가 된다. 교육적으로만 생각하고 교육적으로만 행위하면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교육적’의 경계는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제도로 승화해 내지 못한 개선의 아이디어는 망각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망각은 개선의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학교 현장은 열심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교사는 아쉬우나마 오늘의 그리고 매일의 교육에 집중하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교사에 대한 교육사회의 인식과 행위가 호의적이지 않거나 혹은 폭력적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폭력적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무딘 감수성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라면, 교사는 무방비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게 된다. 이 경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밖에 없다. 즉 교사로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그것마저도 행정적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다.
근래에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포착되는 생활지도의 외주화 경향은 작금의 교사들이 처한 곤란하고 심란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른바 교육적 교육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하였던 임용 초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면, 그나마 교수자의 역할이라도 충실히 해내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소극성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용이하지는 않다. 근래 들어 대중 매체는 부쩍 사교육계 일타강사들을 부각시키고, 이들을 학교 교사들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교육적이며 더욱 매력적인 교육자로 홍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학 입시 결과를 학교교육의 제1목적으로 여기는 풍조가 짙어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래저래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즉, 교사는 내적으로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감내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교육적 책무성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교사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침묵의 압박과 반지성주의적 폭력성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 와중에 교사는 시시각각 딥러닝을 통해 자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는 인공지능의 산물을 교실 현장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그 실체가 불명확한 디지털교과서의 전문가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AI교사와도 그리고 사교육계 일타강사와도 본의 아니게 경쟁의 구도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정작 그런 경쟁의 구도 속으로 교사를 등떠미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문명에게, 시대에게, 국가와 사회에게 따져 묻는 일은 헛헛한 감상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심란하고 외롭다.
이 책의 서두에서 미리 인정하여야 할 것은, 감히 교사의 정치·정책 참여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더 안정적인 교직의 제도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신하는 데까지는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일은 필자보다 더욱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의 식견에 기대어 유능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조력하는 방식으로 진척시켜 나갈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복잡다단하고 심란한 와중에, 그나마 교사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담아 필자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머리말의 서두에서 지적한 낙관적 교육관, 특히 “전지전능 교사관”으로 명명될 만한 특별한 형태의 교육관의 명明과 암暗이다.
“전지전능 교사관”이라는 명명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교육관의 생성 과정을 톺아보면 이것이 전통적 교육학 내에서 대단히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주류적 교육관의 집약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유형의 교육관의 이론적 토대가 불안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능 및 교사의 권능에 대한 과장을 부추긴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이 이론과 관점을 교육의 주요 이론으로 내면화한 교사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스스로에게 주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필자는 염려한다. 아울러 필자는 이러한 관점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과도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이 만연할 경우, 교사 개인의 노력 유무와 무관하게, 혹은 노력할수록 더욱 더 교사의 소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실 역동성은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위와 같은 거대담론의 흐름이 세기전환기에 이미 종결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인간의 보편이성 담론에 근거하여 교육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이론적으로 극대화하였던 근대 교육학의 근대성을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세기전환기에 한 차례 큰 파동을 이룬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학 연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지도 이미 사반세기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근래 학계의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교육의 이상이자 목표로 여겨져온 휴머니티와 휴머니즘을 텅빈 개념이라고까지 비판하면서, 이제 포스트-휴머니티를 교육의 목적으로 새롭게 옹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담론의 파고들이 연속적으로 솟아오르다 보니, 이것이 교육사의 심해를 통째로 밀어낸 듯한 착시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되는 교육학 이론의 형국과 내용을 보자면, 그 심해는 여전히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비교사들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품들은 단기간 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스러지기 다반사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이 심해의 주류적 담론을 화두로 삼아 교육과 교직과 교사를 논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유럽 중세를 시작점으로 하며,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가들과 종교개혁기의 대표적 사상가들의 삶과 사유의 궤적을 좇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에서 필자는 플라톤과 코메니우스와 칸트 등 전통적 교육학의 주류적 이론가들의 사유를 전지전능 교육관이라는 줄로 꿰어서 일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직의 관점에서 논단과 교단에 올리고자 한다. 이 여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전지전능 교육관과 과감하게 결별하라는 권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철학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교육사상사적·교육문화사적 방법, 예술문화사적 방법, 도상학적 방법, 비교문화학적 방법 등이 추가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기성의 교육철학·교육사학 강의의 내용에서 상당 부분 가감이 가해졌기에, 백과사전적 형식의 교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책은 학술논고에서와 같은 내용적·형식적 엄밀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학술논고에서와는 다른 대화적 문체로 작성되었기에, 내용적으로는 학문탐구와 지적 유희를 위한 연구서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교육문화사적, 기독교예술문화사적, 인문학적 교양을 위한 독서의 대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희망하기로는 이 책이 교직 경력의 시작점에 있는 예비교사와 초임교사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원하며, 전지전능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으려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공명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내용이 구성되는 과정 중에 기여해 주신 수많은 예비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은 필자의 말과 글에 관심의 눈빛을 담아 경청해 주었으며, 긍정적·비판적·구성적 피드백을 통해 의미와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모쪼록 필자의 말과 글이 그들의 교직생활에 긍정적인 의미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일상과 학문과 미래를 공유하는 주영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해 늦은 가을 이래로 꾸준히 빛나고 있는 햇살 현晛. 매 학기 필자의 강의록에 등장하는 그의 얼굴은 이 책 속에서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사후적으로나마 초상권을 허락해 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항상 좋은 책이 제작되도록 힘써 주시는 박영스토리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 생명의 탄생의 과정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2025년 봄
우정길
우정길(Jeong-Gil Woo)
독일 Justus-Liebig-University Giessen(Dr. Phil.)
독일 Justus-Liebig-University Giessen 연구강사·강의전임 역임
(現)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現)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
주요저역서
Responsivität und Pädagogik (2007, Dissertation)
Lehren und Lernen mit Bildern (2008, 공저)
Lernen und Kultur (2010, 공저)
마틴 부버의 교육강연집 (2010, 번역)
포스트휴머니즘과 인간의 교육 (2019, Monographie)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2019, 공저)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일제강점기, 저항과 계몽의 교육사상가들 (2020, 편저)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Phänomene der Bildung und Erziehung (2019, 공저)
Confucian Perspectives on Learning and Self-Transformation (2020, 공저)
한나 아렌트와 교육의 지평 (2020, 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김정환의 민족과 종교와 교육 (2021, 공저)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학 (2021, 편저)
독일교육학의 전통과 갈래 (2023, 편역)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Journal Articles
국내 교육학 전문학술지 교육철학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사상연구, 교육문화연구 및 국제 교육철학 전문학술지 Zeitschrift für Pädagogik, Vierteljahr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ädagogik,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등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1장 교육의 은유와 전지전능 교사관 • 5
교육의 은유들 … 6
볼노 ― “비연속적 형식의 교육가능성” … 13
몰렌하우어 ― “부러진 의도성” … 14
이해의 벽 ― 물리적 한계와 실존적 한계 … 16
기억과 기록 … 20
어른과 어린이 ― 교육학의 오래된 인(간)종(류)주의 … 25
전지전능 교사관 … 29
제2장 시대의 균열과 여명의 계기들 • 35
중세의 교육 … 35
교회 권력과 신 중심 문화의 균열 … 41
르네상스 시대와 교육 … 45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 46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아이러니 & 언어적 사회통합 … 57
프로테스트와 전쟁들 … 59
종교개혁과 공교육 … 61
제3장 갈등의 증폭과 전쟁의 비참 • 69
에라스무스와 루터 … 69
신학적 인간학 & 교육학적 인간학 … 77
갈등과 긴장, 그리고 30년 전쟁 … 79
전쟁의 일상 ―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폐허 … 82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 85
코메니우스의 학문적 여정과 저작들 … 87
제4장 교육적 신념의 구조화와 시각화, 그리고 도상학 • 99
언어교수법과 세계도회 … 99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 ― 입학도설과 삼강행실도 … 101
세계도회의 분석 ― 도상학적 방법론 … 104
세계도회의 목차 구성 … 106
150개 범주 & 150개 그림 … 109
시계와 해부학 … 111
라틴어 교수학습의 걸림돌 ― 추상성과 스토리텔링 … 118
세 겹 액자구도 … 119
구성상 특징으로 본 세계도회 … 121
제5장 그림책에 인류 재건의 신념을 담다 • 127
세계도회의 목적 ― 표면적 & 잠재적 … 127
“신”(제1범주) ― 고도의 추상성 … 131
스토리텔링의 불가피성 … 134
세계도회 ― 교육을 통한 인류 사회의 재건 … 136
“신의 섭리”(제149범주) ― 전지(全知)와 전능(全能) … 139
“최후 심판”(제150범주) … 144
교사와 학생, 교육적 관계, 교직과 교육 … 146
이원적 세계관 … 147
제6장 교직의 뜻과 숨은 뜻 - 범교육학의 제안 • 159
교사와 학생 ― 교사상, 교육적 관계, 교직 … 159
두 개의 세계를 관통하는 빛 … 165
교사의 위상 … 169
머리에서 머리로 ― 세계도회의 교육사상사적 위치 … 174
동선성의 숨은 뜻 ― 교사를 위한 관점의 전환 … 177
전지전능 교육관과 “만들수있음의 환상” … 184
코메니우스 ― 세계도회와 범교육학 … 187
17세기의 문명사적 맥락 … 189
제7장 동굴의 비유와 빛의 교육학 • 195
동굴의 비유 … 195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 202
동굴의 비유 ― 도상학적 분석 … 207
교육의 공간 … 207
두 개의 길 ― 교육의 길(I)과 교육자의 길(II) … 209
철인과 교사 … 211
동굴의 비유 ― 교육학적 해석의 예 … 213
제8장 이상주의의 명암(明暗)과 교육 • 221
이데아 … 221
교육의 목적 … 225
이데아와 Idealism(이상주의) … 229
이상주의와 교육 … 231
이상주의의 그림자 … 232
타락한 이상주의 … 236
나치의 국가사회주의 교육 … 239
교육이 타락한 이상주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 244
제9장 이성과 자유, 그리고 교육학에 대하여 • 251
교육학에 대하여(1803) … 257
합리론과 경험론 … 258
칸트 ―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맹목적이다.” … 262
‘비판’철학 = 인간의 인식 작용 자체에 대한 검토 … 263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 … 267
독일 관념론(Idealismus. 이상주의)의 흐름 … 268
제10장 자유를 위한 부자유의 교육 • 287
이원적 인간학과 결핍존재론 … 287
20세기 생물학적 인간학 … 293
발라우프 ― “생물학적 인간학의 교육학적 부적절함”(1962) … 295
하이데거 ― 인간 이해를 위한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은 시도들에 대한 비판 … 298
‘비교적 인간’과 ‘교육적 인간’ … 299
대리인 기능 ― 자율과 타율 사이의 교육 … 302
체벌에 관하여 … 307
칸트 ― 강제의 불가피성 … 309
‘부자유를 통한 자유’의 딜레마 … 310
제11장 전지전능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교사를 위한 변론 • 319
“우리 자체가 이미 인간이기 때문이다!” … 321
교육학적 인(간)종(류)주의 … 324
괴리 ― 일상의 언어와 이론의 언어 … 325
교육의 시작점 ― 일상적 인간 이해 … 329
호모 에두칸두스(Homo Educandus)에 관하여 … 331
오래된 습관과 결별하기 ―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존재 … 333
참고문헌 • 340
찾아보기 •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