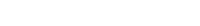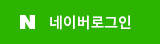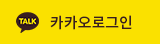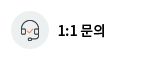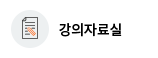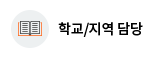중판 2015. 8. 30
초판 2014. 6. 30.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가 겪은 전대미문의 불황은, 과연 금융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게 만든다. 특히 이 금융위기이후의 심각한 불황타개책으로 취해졌던 양적 팽창(Quantitative Easing)정책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궤를 벗어났던 만큼, 다시금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틀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양적 팽창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Tapering)이 취해지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생산성과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했던 자본주의체제가, 최근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과연 지속가능한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대체 자본주의의 어떤 요인이 자본주의를 자기파괴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주목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이 과연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개념의 철학적 바탕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스러움으로, 최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구조적 특성을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를 확대 재생산시켜온 금융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어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개념의 기반과 그 타당성도 되짚어보고자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금융자본주의의 미로에서, 미국 등 서방 금융대국들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심각한 홍역을 치러왔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우리경제의 내재적인 각종 구조적 문제점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대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인류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배운 것은, 끊임없는 새로운 생산력과 기술력의 등장에 따라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도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홍역은, 바로 이 금융자본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신호이다. 이러한 진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인류전체의 과제이다. 세계경제사에서 압축경제성장의 모델로 거론되어온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대안모색과정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 이 조그만 노력이 우리경제와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화담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어수선한 원고들을 깔끔한 책으로 만들어준 박영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
2014년 초여름,
미세먼지와 소음들을 모두 빨아들이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비원 숲 언저리를 바라보며,
김영한 씀
초판 2014. 6. 30.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가 겪은 전대미문의 불황은, 과연 금융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게 만든다. 특히 이 금융위기이후의 심각한 불황타개책으로 취해졌던 양적 팽창(Quantitative Easing)정책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궤를 벗어났던 만큼, 다시금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틀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양적 팽창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Tapering)이 취해지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생산성과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룩했던 자본주의체제가, 최근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과연 지속가능한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대체 자본주의의 어떤 요인이 자본주의를 자기파괴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주목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이 과연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개념의 철학적 바탕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자본주의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스러움으로, 최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구조적 특성을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를 확대 재생산시켜온 금융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어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개념의 기반과 그 타당성도 되짚어보고자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금융자본주의의 미로에서, 미국 등 서방 금융대국들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심각한 홍역을 치러왔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우리경제의 내재적인 각종 구조적 문제점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대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인류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배운 것은, 끊임없는 새로운 생산력과 기술력의 등장에 따라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도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지금 금융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홍역은, 바로 이 금융자본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신호이다. 이러한 진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인류전체의 과제이다. 세계경제사에서 압축경제성장의 모델로 거론되어온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대안모색과정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 이 조그만 노력이 우리경제와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진화담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어수선한 원고들을 깔끔한 책으로 만들어준 박영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
2014년 초여름,
미세먼지와 소음들을 모두 빨아들이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비원 숲 언저리를 바라보며,
김영한 씀
김영한(金暎漢)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전전하다가,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을 주로 공부하였다. 귀국 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요즘도 국제경제학, 특히 동아시아경제통합이 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부와, 세계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정책조정체계 및 금융감독정책 관련 국제정책조정체계에 관시믈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개방화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의 산업경쟁령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Paul Krugman 교수와 Anthony Venables 교수와 함께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Palgrave, 2007)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전전하다가,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을 주로 공부하였다. 귀국 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요즘도 국제경제학, 특히 동아시아경제통합이 아시아의 국제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부와, 세계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정책조정체계 및 금융감독정책 관련 국제정책조정체계에 관시믈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개방화 과정에서 한국경제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의 산업경쟁령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Paul Krugman 교수와 Anthony Venables 교수와 함께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Palgrave, 2007)라는 책을 낸 바 있다.
Chapter01 들어가는 말
Chapter_02 세계금융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I. 세계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출발점: 자산시장에서의 거품형성
1. 미국자산시장 및 부동산 거품의 출발점: 주택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구조
2.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제공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3.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통한 전체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II.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합리성
1. 금융산업의 이윤 및 부가가치의 원천
2. 금융시스템의 변질: 자산가격의 시세차익 극대화 추구
3. 도덕적 해이를 확대재생산한 투기적 자산시장
4. 거래비용감소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확대와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5. 금융규제완화와 도덕적 해이의 확산
6. 위기증폭기제로서의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7. 지속가능한 금융자본주의의 요건
8. 세계금융위기와 금융감독정책
(1) 금융위기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감독정책
(2) 금융감독정책의 국제정책조정과 거시경제정책조정
Chapter_03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이념인가?
I.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1. 사회적 합리성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의 본래적 가치
2. 개인적 합리성만을 추구한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와 자기모순
3. 자기파괴적 금융혁신: 신금융상품과 신금융기법의 위기
(1)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능과 구조적 위기
(2) 초단기 금융거래전략과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II. 금융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2. 금융자본주의의 자기실현적 위기의 원인
Chapter_04 경제적 합리성의 철학적 근거
I. 경제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1. 합리성의 정의
2.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진화
3. 경제적 합리성의 정의
II.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1.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2.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1) 경제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조건
(2) 과학의 목적과 과학적 설명의 조건
(3)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4.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일 수 있는가?
Chapter_05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I.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기본요건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요건: 혁신동기와 자본주의
2. 한국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II.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보편적 복지정책: 복지포퓰리즘 논쟁
2.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대기업 규제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3.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선결조건: 투기적 금융산업을 효율적 자본중개산업으로 회복시키는 정책
4. 지속가능한 무역자유화정책
5.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선결과제로서의 대북한경제정책
6. 지속가능한 세계자본주의를 위한 한국경제의 역할
부록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에 대한 이론모형구조
부록 2 금융시장의 상보성과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이론모형분석
Chapter_02 세계금융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I. 세계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출발점: 자산시장에서의 거품형성
1. 미국자산시장 및 부동산 거품의 출발점: 주택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택담보대출시장구조
2.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제공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3.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통한 전체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II. 세계금융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합리성
1. 금융산업의 이윤 및 부가가치의 원천
2. 금융시스템의 변질: 자산가격의 시세차익 극대화 추구
3. 도덕적 해이를 확대재생산한 투기적 자산시장
4. 거래비용감소에 따른 투기적 거래의 확대와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5. 금융규제완화와 도덕적 해이의 확산
6. 위기증폭기제로서의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7. 지속가능한 금융자본주의의 요건
8. 세계금융위기와 금융감독정책
(1) 금융위기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감독정책
(2) 금융감독정책의 국제정책조정과 거시경제정책조정
Chapter_03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이념인가?
I.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1. 사회적 합리성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의 본래적 가치
2. 개인적 합리성만을 추구한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와 자기모순
3. 자기파괴적 금융혁신: 신금융상품과 신금융기법의 위기
(1)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능과 구조적 위기
(2) 초단기 금융거래전략과 금융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II. 금융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2. 금융자본주의의 자기실현적 위기의 원인
Chapter_04 경제적 합리성의 철학적 근거
I. 경제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1. 합리성의 정의
2.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진화
3. 경제적 합리성의 정의
II.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1.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2.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1) 경제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조건
(2) 과학의 목적과 과학적 설명의 조건
(3) 경제학은 엄밀한 과학인가?
4.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일 수 있는가?
Chapter_05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I.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기본요건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요건: 혁신동기와 자본주의
2. 한국자본주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II.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를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보편적 복지정책: 복지포퓰리즘 논쟁
2.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대기업 규제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
3.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선결조건: 투기적 금융산업을 효율적 자본중개산업으로 회복시키는 정책
4. 지속가능한 무역자유화정책
5.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선결과제로서의 대북한경제정책
6. 지속가능한 세계자본주의를 위한 한국경제의 역할
부록 1 금융자본주의의 체제안정성(regime stability)조건: 자기실현적 금융위기에 대한 이론모형구조
부록 2 금융시장의 상보성과 자기실현적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이론모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