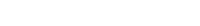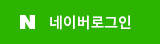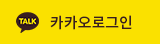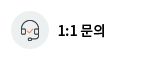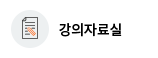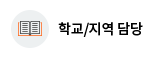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상업과 그 기록의 역사가 있다. 서양에는 상업과 공업을 주축으로 한 경제사와 그를 뒷받침하는 복식부기가 있었으며, 중국에는 중국 나름의 상ㆍ공업을 뒷받침하는 사각장(四脚帳)ㆍ용문장(龍門帳)이 있었고, 일본에도 대복장(大福帳)과 그들 나름의 복식부기가 있었다. 한국도 “사개송도치부법” 또는 “송도사개치부법”이라고 불리는 “사개치부법”이 우리의 고유치부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린 사람들은 일본의 회계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일본회계학자들이 사개치부법을 세계에 소개한 내용은 각양각색이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회계학자는 사개치부법이 이태리의 복식부기보다 200년 앞서서 창안된 것으로 소개하였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서양식 복식부기를 한국적인 치부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한 회계학자도 있었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일본의 한 회계학자가 사개치부법은 단식부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본다.
1945년 이후에 발표된 한국회계학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사개치부법에 관한 연구들도 일본회계학자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의 해설이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본회계학자들의 주장을 인용 해설하거나 소설에 가까운 추론에 의한 연구물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사개치부법의 고려조 기원설, 조선조 초기 기원설, 조선조 중기 기원설 등을 지지하는 논문과 이태리의 복식부기성립에 사개치부법이 영향을 주었다는 저서까지 출현하였다.
저자들은 일본의 몇 몇 학자의 연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회계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가 별로 신빙할 만 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하는 사개치부법 연구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추론도 증거를 기초로 한 결론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시도로 1899년에서부터 1905년까지의 “대한천일은행의 회계문서”를 실증 분석하였고, “사개송도치부법 전사(前史)”란 저서에서는 그 실증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 조선조의 산원(算員), 즉 당시의 공인회계사에 해당한 산사(算士), 계사(計士), 회사(會士)제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 책은 “사개송도치부법 전사”를 발간한 이후 새로 발굴된 사개회계문서가 있었고,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문서 일부가 북한의 저명한 학자에 의하여 저술된 책자에서 발굴 되었으며, 前史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소개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대대적인 수정ㆍ보완을 한 것이다.
저자들의 기본입장은 철저한 “증거주의”이며, 거기다 “논리적 연관성”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주의적 논리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논리를 존중하고,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문서 중 그 일부의 기록내용을 확인 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사개치부법의 일부 특성은 입증하였지만 북한에 “있다”고만 소개한 사개문서에 관하여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도 가까운 장래에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신경을 썼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본의 藤田昌也교수가 사개치부법이 단식부기라고 한 것과, 둘째로 국내에서 발굴된 한 가문의 친목계 기록을 복식부기라고 주장한 기사 때문이었다. 이 후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예봉(銳鋒)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회계문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두(吏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리고 회계정보차원을 강조하는듯하면서 여전히 그 문서가 복식부기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듯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두(吏讀)는 필자의 “사개송도치부법 전사” 중 관부(官府)문서에서 많이 사용하였음을 설명한바 있고, 이 책에서도 똑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개치부 문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무엇이 복식부기인가?”라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를 구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능한 한 많은 사개회계문서를 발굴하여 그 치부원리를 축출하고 그것이 복식부기와 어떻게 같고, 어떤 면에서 틀리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들이 발굴하여 분석한 사개회계문서가 과거ㆍ현재의 어느 다른 연구보다도 많음을 자부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사의 일부인 한국회계사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는 많은 원시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 회계사(會計史)연구를 위한 자료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바로는 회계사 연구자들 보다는 경제사 연구자들이, 경제사 연구자들 보다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더 많은 자료와 그 원천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고문서 수집가들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장(保藏)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원컨대 우리나라 회계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그 원천을 가지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다.
이 책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단견(短見)의 소치이므로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면 한다.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회계문서는 연대로 보나 그 기록내용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것의 입수에 도움이 될 정치적 분위기도 점차 호전되는 느낌이므로 앞으로 그 자료가 입수되면 이 책을 다시 보완하게 될 것으로 예견한다.
사개회계문서는 예외 없이 한자로, 그것도 초서로 기록되고 있어 그 판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도움을 주신 분들(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 번역 위원들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 고문서 번역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자료의 원천과 대출에 많은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주인기 교수와 국사편찬위의 정병욱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많은 수고를 끼친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도 같은 심정이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편집을 맡아 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6년 2월
조익순ㆍ정석우
그러나 일본회계학자들이 사개치부법을 세계에 소개한 내용은 각양각색이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회계학자는 사개치부법이 이태리의 복식부기보다 200년 앞서서 창안된 것으로 소개하였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서양식 복식부기를 한국적인 치부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한 회계학자도 있었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일본의 한 회계학자가 사개치부법은 단식부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본다.
1945년 이후에 발표된 한국회계학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사개치부법에 관한 연구들도 일본회계학자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의 해설이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는 일본회계학자들의 주장을 인용 해설하거나 소설에 가까운 추론에 의한 연구물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사개치부법의 고려조 기원설, 조선조 초기 기원설, 조선조 중기 기원설 등을 지지하는 논문과 이태리의 복식부기성립에 사개치부법이 영향을 주었다는 저서까지 출현하였다.
저자들은 일본의 몇 몇 학자의 연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회계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가 별로 신빙할 만 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하는 사개치부법 연구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추론도 증거를 기초로 한 결론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시도로 1899년에서부터 1905년까지의 “대한천일은행의 회계문서”를 실증 분석하였고, “사개송도치부법 전사(前史)”란 저서에서는 그 실증 분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 조선조의 산원(算員), 즉 당시의 공인회계사에 해당한 산사(算士), 계사(計士), 회사(會士)제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 책은 “사개송도치부법 전사”를 발간한 이후 새로 발굴된 사개회계문서가 있었고,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문서 일부가 북한의 저명한 학자에 의하여 저술된 책자에서 발굴 되었으며, 前史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소개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대대적인 수정ㆍ보완을 한 것이다.
저자들의 기본입장은 철저한 “증거주의”이며, 거기다 “논리적 연관성”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주의적 논리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논리를 존중하고,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문서 중 그 일부의 기록내용을 확인 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사개치부법의 일부 특성은 입증하였지만 북한에 “있다”고만 소개한 사개문서에 관하여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도 가까운 장래에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신경을 썼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본의 藤田昌也교수가 사개치부법이 단식부기라고 한 것과, 둘째로 국내에서 발굴된 한 가문의 친목계 기록을 복식부기라고 주장한 기사 때문이었다. 이 후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예봉(銳鋒)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회계문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두(吏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리고 회계정보차원을 강조하는듯하면서 여전히 그 문서가 복식부기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듯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두(吏讀)는 필자의 “사개송도치부법 전사” 중 관부(官府)문서에서 많이 사용하였음을 설명한바 있고, 이 책에서도 똑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개치부 문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무엇이 복식부기인가?”라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를 구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능한 한 많은 사개회계문서를 발굴하여 그 치부원리를 축출하고 그것이 복식부기와 어떻게 같고, 어떤 면에서 틀리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들이 발굴하여 분석한 사개회계문서가 과거ㆍ현재의 어느 다른 연구보다도 많음을 자부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사의 일부인 한국회계사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는 많은 원시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히 이 회계사(會計史)연구를 위한 자료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바로는 회계사 연구자들 보다는 경제사 연구자들이, 경제사 연구자들 보다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더 많은 자료와 그 원천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고문서 수집가들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장(保藏)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원컨대 우리나라 회계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그 원천을 가지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다.
이 책에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단견(短見)의 소치이므로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면 한다. 북한에 실존하는 사개회계문서는 연대로 보나 그 기록내용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것의 입수에 도움이 될 정치적 분위기도 점차 호전되는 느낌이므로 앞으로 그 자료가 입수되면 이 책을 다시 보완하게 될 것으로 예견한다.
사개회계문서는 예외 없이 한자로, 그것도 초서로 기록되고 있어 그 판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도움을 주신 분들(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 번역 위원들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 고문서 번역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자료의 원천과 대출에 많은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주인기 교수와 국사편찬위의 정병욱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 많은 수고를 끼친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도서실,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도서관에도 같은 심정이다.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편집을 맡아 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6년 2월
조익순ㆍ정석우
조 익 순
부산대학교 상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수학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
고대출판부장, 상과대학장, 사무처장, 기업경영연구소장, 경영대학원장 등 역임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세무학회장 역임
공인회계사
국세심판비상임심판관
지방세제심의위원ㆍ지방세심사위원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고문
정 석 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졸업(경영학 박사)
미국 뉴욕주립대 객원 조교수
한국공인회계사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부산대학교 상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수학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
고대출판부장, 상과대학장, 사무처장, 기업경영연구소장, 경영대학원장 등 역임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세무학회장 역임
공인회계사
국세심판비상임심판관
지방세제심의위원ㆍ지방세심사위원
외부감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고문
정 석 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졸업(경영학 박사)
미국 뉴욕주립대 객원 조교수
한국공인회계사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제1장 서 설
제2장 사개송도치부법의 평가를 위한 주변사항의 이해
제3장 복식부기 생성의 전제조건
제4장 현병주; 사개송도치부법의 전부
제5장 현병주 사개송도치부법 이전의 회계문서에 대한 실증적 분석 - 관부문선
제6장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 이전의 회계문서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사인(상인) 회계문서
제7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도래인과 기독교 등이 우리의 고유부기에 미친 영향
제8장 사개송도치부법과 그 이전의 회계문서에 관한 실증분석
제2장 사개송도치부법의 평가를 위한 주변사항의 이해
제3장 복식부기 생성의 전제조건
제4장 현병주; 사개송도치부법의 전부
제5장 현병주 사개송도치부법 이전의 회계문서에 대한 실증적 분석 - 관부문선
제6장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 이전의 회계문서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사인(상인) 회계문서
제7장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도래인과 기독교 등이 우리의 고유부기에 미친 영향
제8장 사개송도치부법과 그 이전의 회계문서에 관한 실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