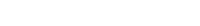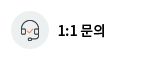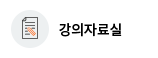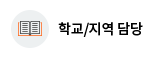_상세페이지 800.jpg)
중판발행 2021.05.18
초판발행 2020.11.10
모든 학문분야가 그렇듯이 법학도 그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고유한 언어게임을 한다. 법학의 언어게임은 그 학문의 대상인 실정법 자체의 체계와 자기완결성에서 비롯한 고유한 논리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렵다. 법학이 학제적 연구에 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학, 뇌과학, 심리학, 심지어 철학도 그 논의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대중과 널리 공유하지만 유독 법학만은 그 전문용어의 압축코드를 일반교양 차원으로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법학적 언어게임의 폐쇄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자신 있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법학교양서 하나를 서점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그 열망 탓인지는 몰라도 헌법학에서는 그래도 일반대중을 겨냥한 교양 수준의 책이 몇 권 출간되어 있긴 하다. 형법학에도 그런 류의 책을 하나 쓰고 싶은 소망을 나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와 ‘법을 읽는 12가지 코드’라는 제목까지 붙여 가며 집필을 시작하다가 내공 부족을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07년 여름 해외에서 연구년을 보내던 중에 모두들 물 건너간 듯 여겼던 로스쿨법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영어공부 삼아 읽고 있었던 대중소설 <The Colour of Law>를 한국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얼기설기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기형적으로 탄생한 로스쿨제도가 가져오게 될 사법체계의 지형변화를 일반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알리는 동시에 로스쿨 지망생이나 재학생들에게도 쉽게 전달 가능한 메시지가 이 책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번역작업이 이제야 그 완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 소설은 원제 그대로 ‘법의 색깔’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미국의 하급심 형사법정을 가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겠지만, 7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특히 미국의 남부에서 법은 노골적으로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적용상의 차등을 두고 있었다. 그 이후 전 세계의 법체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인권사상 때문에 법에 채색된 피부색이 적어도 표면상으로 희석되었지만, 법의 색깔은 다시 돈의 색깔로 물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법적 결정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미국의 법 현실을 변호사의 시각을 통해 그려 내고 있는 이 소설의 이야기는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법은 어떤 의미로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돈과 결부되어 있다. 출발시점부터 어느 법학교수에 의해 ‘돈스쿨’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과거 법과대학에의 진학을 위한 1순위의 동기였던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표면상의 동기목록에서 조차도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신입생조차도 대형로펌의 고액연봉은 0순위의 동기로서 더 이상 속내에 감춰야 할 이유도 아니다. 최고급 승용차에 고가의 주택에 살면서 상류사회를 꿈꾸는 <The Colour of Law>의 주인공 변호사 스콧의 사고와 행동은 한국사회의 통상적인 변호사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법의 색깔과 돈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가 있을까?
그러나 <The Colour of Law>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소설은 법의 색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용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국의 법정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변호사에 대한 풍자와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한 이 책의 줄거리에 관한 개인적 감상을 스케치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공 스콧의 인간됨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교훈조로 읊어 가는 일은 번역자가 할 소임은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장광설을 뒤로 하고 이 책을 읽어 나감에 있어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가 변호사를 기본적 인권의 옹호자이자 사회정의의 실현주체로 적고 있지만, 현실 속의 변호사는 여전히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스콧)도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명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변호사를 돈 많은 의뢰인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소설속의 미국식 형사변호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장(뷰퍼드 판사)의 소송지휘를 보면 검사와 피고인은 대립 당사자일 뿐이고 재판관은 스포츠 시합의 심판처럼 선수들의 반칙만 감시할 뿐인 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미국식 당사자주의 구조가 능사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법적 결정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가?
- 형사재판이 운동경기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이기게 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형사변호인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국선변호인으로 하면 어떨까?
- 당신이 만약 변호사라면 당신이 맡은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부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경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법률서적 관련 국내 최고의 출판사인 박영사가 소설, 그것도 번역소설을 출간하기로 모험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산파 역할을 해 준 조성호 이사님의 용단과, 그리고 초벌원고를 꼼꼼하게 살피고 정성스럽게 윤문하여 직역위주의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충해 주고 문어체의 어색함을 보완해 준 편집부 박송이 대리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내 노트북 속의 번역 파일의 원고는 지금도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지 모른다.
2020년 10월
옮긴이
지은이 마크 히메네즈 Mark Gimenez
마크 히메네즈는 갤버스턴 카운티에서 자라 텍사스 주립대와 노트르담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가 되어서는 댈러스 소재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Colour of Law)> 외에도 <The Abduction>, <The Perk>, <The Common Lawyer>, <Accused>, <The Governor’s Wife>, <Con Law>, <The Case Against William>, <The Absence of Guilt>, <End of Days(Con Law II)>, <Tribes>, 그리고 아동 소설인 <Parts & Labor: The Adventures of Max Dugan>을 포함한 11개 소설의 작가이다. 그의 책들은 영국, 아일랜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서 전 세계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15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The Perk>은 존 코널리와 디클런 버크가 편저자인 <죽이는 책: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들이 꼽은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들>에 수록되었다.
옮긴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공 교수
역서 <독일형사소송법>, <도덕의 두 얼굴>, <미국형사소송법>
저서 <기업처벌과 미래의 형법>, <형법총론(제6판)>, <형법각론(제6판)>